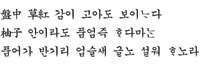조선의 문인 박인로가 이덕형을 만나러 갔다 돌아오던 날도 요즘 같은 가을날이었을 것이다. 같은 연배의 문신 이덕형이 영창대군의 처형과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다가 삭탈관직削奪官職되어 은거하고 있었을 때였으리라. 경기도 양수리, 손님을 배웅하는 길섶엔 억새가 하늘거리고 구절초 보랏빛 꽃이 맑게 피어 있었겠다. 벼가 누렇게 익어 황금빛으로 펼쳐진 들판이 보이는 길목, 배웅하는 오리장 지점의 주막에서 이별주가 차려진 상위에 놓인 홍시는 안채에서 내어준 것을 심부름 소년이 조심스레 들고 따른 것일 듯하다. 홍시가 놓인 소반을 앞에 두고 마주앉은 두 선비의 맑은 얼굴이 순간 가을 석양빛으로 물들었을 것 같다.
중국 삼국시대 때 손권의 모사謀士였던 육적은 원술을 방문하였던 여섯 살 때 차려 내어온 귤 세 개를 어머니께 갖다드리겠다고 몰래 가슴에 품었다지만, 홍시를 품어가도 반길 어머니가 없는 박인로의 서러웠던 심정이 절절한 시가 되었다.
감은 추운 날 더욱 그 진가를 드러낸다. 찹찹하니 입 안에 스며드는 단맛이 일품이다. 맛도 맛이거니와 그리움과 추억이 배어나는 것이 감이다. 상 위에 차려진 감을 선뜻 먹지 못하고 시 한 수를 읊은 박인로의 심정도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홍시를 좋아하던,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선비의 아픈 마음이 선연히 전해온다.
다른 과일과 달리 겉과 속이 같은 빛깔의 감은 충과 효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차려지는 빨간 홍시는 어떤 과일보다 단연 으뜸이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껴 두었다가 내어놓는 겨울날의 홍시는 그 빛깔만큼이나 정이 묻어난다. 먹을거리가 많은 요즘에야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네 어릴 적만 하더라도 홍시는 귀한 대접이었다.
감나무가 많은 산골에 들어와 살면서 감이 익을 때마다 나도 사무친 그리움에 젖는다. 봄이면 감나무마다 넉넉하게 거름을 내어 가을날 주렁주렁 달린 감을 바라보며 흡족한 웃음을 지우시던 아버지가 그립고, 겨울이면 홍시를 뒤주 안에 감춰 두었다가 하나 아들인 오빠에게만 내어 주던 야속하던 어머니가 그립다.
참으로 정하게 흙을 일구며 살다 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산골에 집을 지으면 가장 먼저 감나무를 심겠다고 다짐하였던 나는 이곳 산골에 황토집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감나무를 여러 그루 베어내어야만 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터가 감나무 밭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밭 둘레와 집 둘레에 스무 그루가 넘는 감나무가 있어 나 혼자 돌보기에 벅차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감을 딸 때이다. 높은 가지에 달린 감을 일일이 장대로 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곧잘 땅에 떨어져 못 쓸 것이 되곤 하였다.
익어 가는 감을 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감을 잘 딸 것인가 궁리를 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장문자 씨죠? 이번에 출간한 《풍경속의 집》을 읽었습니다. 그곳에 감나무가 많지요? 제가 고안하여 만든 감 따는 감조리를 보내드릴 테니 마을사람들과 나눠 쓰세요."
"저…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요?"
"나는 이대철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오래 전에 산골로 들어와서 사는데 《얘들아, 우리 시골 가서 살자》를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책을 읽고 선물까지 보내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튿날 감조리 50개가 든 큰 상자가 배달되어 왔다. 나는 곧 이장에게 알렸으며, 이장은 오토바이에 상자를 싣고 아랫마을 윗마을 집집마다 사정을 전하며 하나씩 선물했다.
오래전에 터 잡은 산골이 도시가 되어 다시 강원도 어느 골짝을 찾아들어 가겠다는 이대철 씨의 전화 목소리는 참 씩씩하다. 그곳 '하늘말 농장'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화 목소리에 담겨 있다. 이 가을, 감이 익어 가는 감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나는 선물 받은 장대로 홍시를 따며 고마운 하늘말 농장의 주인을 생각한다.
바람 부는 겨울, 혹여 그분이 청도를 들리시면 나는 아껴두었던 홍시를 고운 시엽지에 받쳐 대접할 것이다. 후세에 남을 시 한 수 읊지 못하더라도 이미 오늘 이곳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시보다 아름답다.田
글 장문자<수필가〉